티스토리 뷰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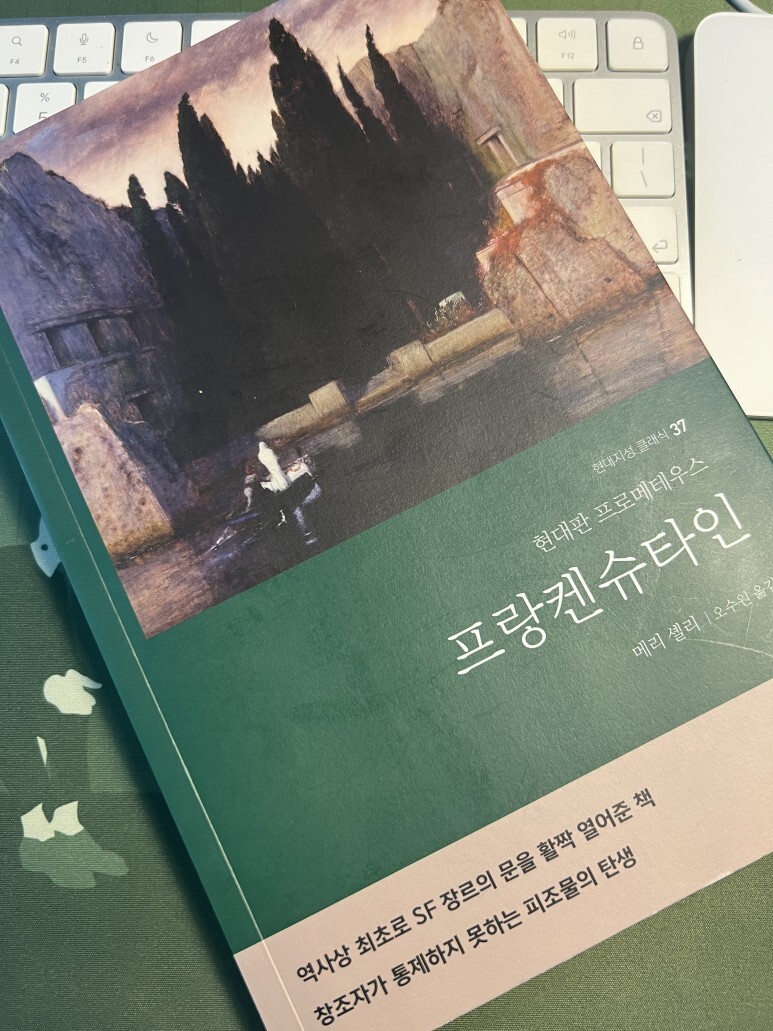
- 저자
- 메리 셸리
- 출판
- 현대지성
- 출판일
- 2021.05.21
이 책을 읽기전까지 나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인줄 알았다. 그럴 수 밖에 없던 것이 만화나 게임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었으니깐.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의 이름이었다. 그러니깐 괴물은 그저 무명의 괴물이었고, 자연철학에 미쳐 괴물을 만든 창조주의 이름이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었다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은 녹색피부에 목에 볼트를 달고 있는 모습이거나 그게 아니면 창백한 피부에 넓은 이마가 눈두덩이와 이어져 무서운 외형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만화에 나오는 프랑켄슈타인이고, 후자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원작에서 말하는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은 앞서 말한 두 모습보다 더 범상치 않다. 얼굴의 살가죽은 바늘로 꿰맨것 마냥 여기저기 흉터가 있고 창백한 피부는 거의 시체와 가깝다. (연금술에 가까운 자연철학)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
소설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전에 잠깐 탄생비화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친구들끼리 늦은밤 모여 무서운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무서운 이야기 말하기 놀이로 시작된 이 괴물의 탄생은 그렇게 진부한 구성 동화같이 시작되었다. 진부한 스토리임에도 흥미진진하게 재밌는 소설이 된 것은 어쩌면 이 소설만의 액자식(의 액자식) 구성이라는 독특한 방법때문이 아닐까 싶다.
로버트 월턴이라는 탐험가의 편지로 시작된 소설은 로버트 월턴이 탄 탐험배가 북쪽으로 탐험을 하던 중 빙산을 만나는데 여기서 조난당할뻔한 어느 한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로버트 월턴은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조난자를 극진히 보살폈고 어느정도 힘을 차린 조난자는 자신의 이름을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 밝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로버트 월턴이 누이에게 쓰는 편지로 이야기가 시작되어 로버트 월턴이 보고 듣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즉,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지만 화자는 로버트 월턴이라고 볼 수 있었다.
[프랑켄슈타인] 소설은 전체적으로 1인칭 기법으로 쓰여졌지만 중간 중간 그 대상이 바뀐다. 소설 초반에 로버트 월턴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으로 바뀌고 중간쯤에 괴물의 1인칭으로 바뀐다. 그리고 다시 빅터프랑켄슈타인을 거쳐 마지막은 로버트 월턴으로 시점이 되돌아온다. 그렇다보니 나는 이 소설의 구성을 액자의 액자식 구성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러하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연철학이자 화학분야에 심취해 생명의 불꽃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되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막상 탄생한 괴물을 보고 혼비백산 도망을 친다. 그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동생이 살해당한다. 가해자로 밝혀진 유스틴은 사형을 당하는데 빅터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진짜 범인이 자신이 만든 괴물임을 알고 두려움에 빠진다. 어느날 괴물과 마주한 빅터는 괴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지만 그 부탁은 결코 이룰수 없음에 괴물과 대치하는데.....
자신이 만든 피조물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빅터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괴물을 쫒아 북극으로 오게 되었고 괴물을 찾아 복수하기전에 결국 로버트 월턴의 배에서 생을 다한다.
자신의 창조주가 생을 다하자 괴물은 자신을 죽일 듯 추적해온 창조주를 되려 찾아온다. 그것을 목격한 월튼은 괴물을 배려해주는데. 괴물은 가장 북쪽으로가 자신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다는 말과 함께 소설은 끝난다.
2022년에 바라본 [프랑켄슈타인]
이 소설은 탄생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도 그런 것이 1800년대의 시대는 여성보다는 남성우월주의 시대로 여성이 만들어낸 말도 안되는 상상력의 집합이라고 대차게 까였다. 하지만 문학의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었지만, 상업적인 분야에서 이 소재는 이른바 돈이 되는 소재였다. 영화를 시작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더니 시대를 지나면서 영화뿐만아니라 만화, 게임에도 등장했고 결국 문학작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만일 이 소설이 지금 시대에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1800년대와 같이 작가가 여성이라서? 사실 그런 이유보다는 소설의 주요 내용이 윤리적인 측면과 개연성을 상식이상으로 벗어나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개연성 하나만으로도 이 소설은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 같다.
물론 윤리 + 개연성을 배제하면 재밌는 공상과학 소설임은 분명하다.
최근에 보았던 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글쓰기, 코인, 주식,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다. 숫자에서 벗어나 마음을 정화시키고자 선택한 현대문학인데.....고구마같은 결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내가 바라 본 [프랑켄슈타인]
이제 개인적인 소감을 이야기해본다.
"책을 덮고 한편의 뮤지컬을 본 느낌이었다"
물론 동명의 뮤직컬도 있다. 하지만 그 뮤직컬을 나는 못 봤다. [프랑켄슈타인]의 배경은 1800년대다. 흔히 우리가 장발장으로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의 배경도 18세기 이쯤인데,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읽다보면 <레미제라블>의 뮤직컬이 떠오른다.
단순히 비슷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는 아니다. 저자 메리 셀리는 소설속에서 주인공들의 감정을 서정적인 가사(대사)로 노래하듯이 풀어나간다. 또한 단순한 대화도 세상을 찬미하며 상대를 추앙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름다운 미사어구도 잔뜩 들어간다. 이런 문장들이 모여서 뮤지컬같은 느낌을 받았다.
왜 이 책의 카테고리가 문학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1810년도 쯤 레미제라블은 1850년도 쯤으로 약 40년정도의 시댁적 차이는 있다.
'Review-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엘리어트 파동 - AJ프로스트외 3명 (0) | 2023.04.30 |
|---|---|
| 차트 패턴 - 토마스 N.불코우스키 (0) | 2023.04.28 |
| 하얼빈-김훈 (1) | 2023.04.24 |
| "더이상 불편하지 않은, 불편함 없는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2 - 김호연 (0) | 2023.04.11 |
| 나는 프랑스 책벌레와 결혼했다 - 이주영 (0) | 2021.11.15 |
